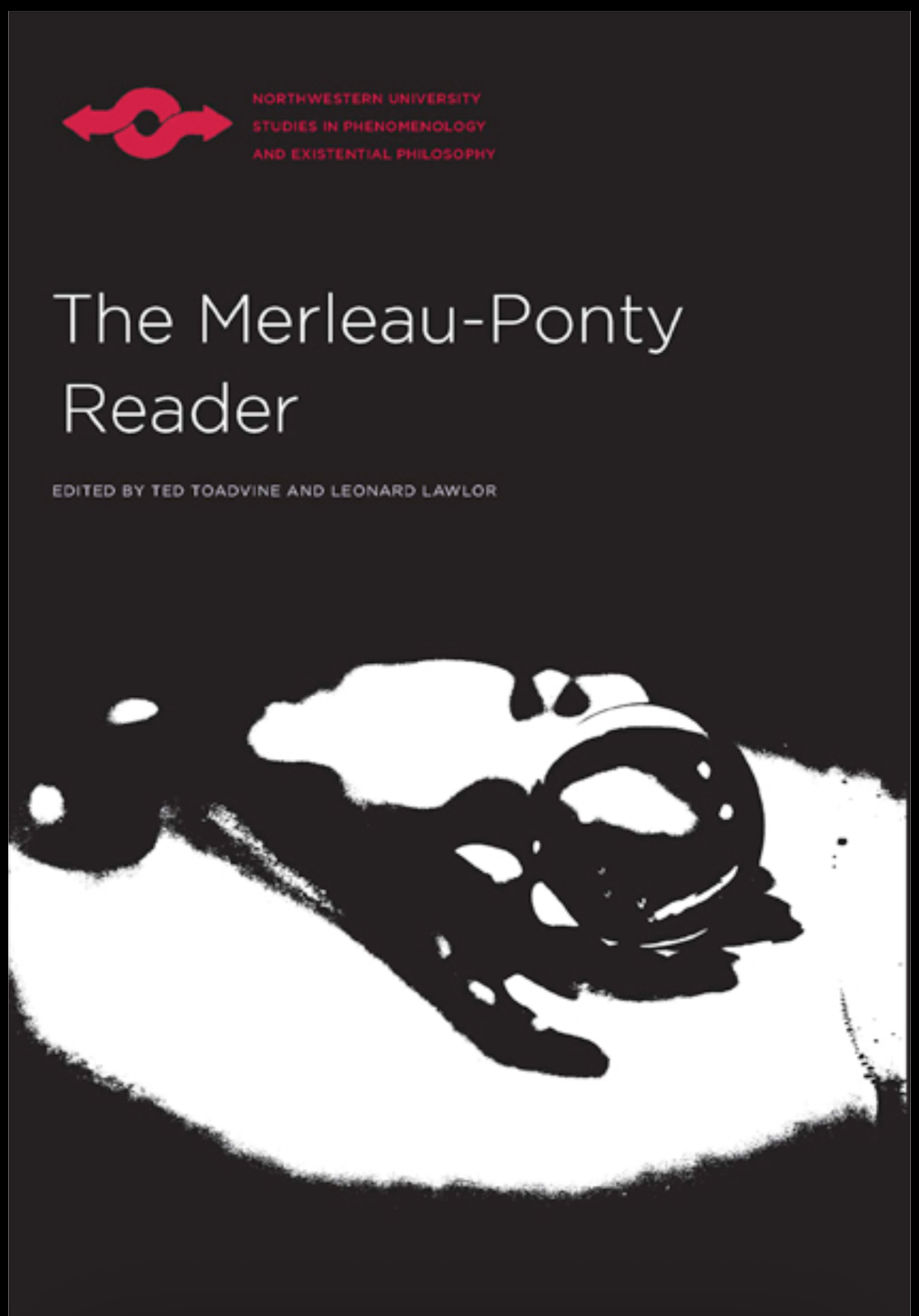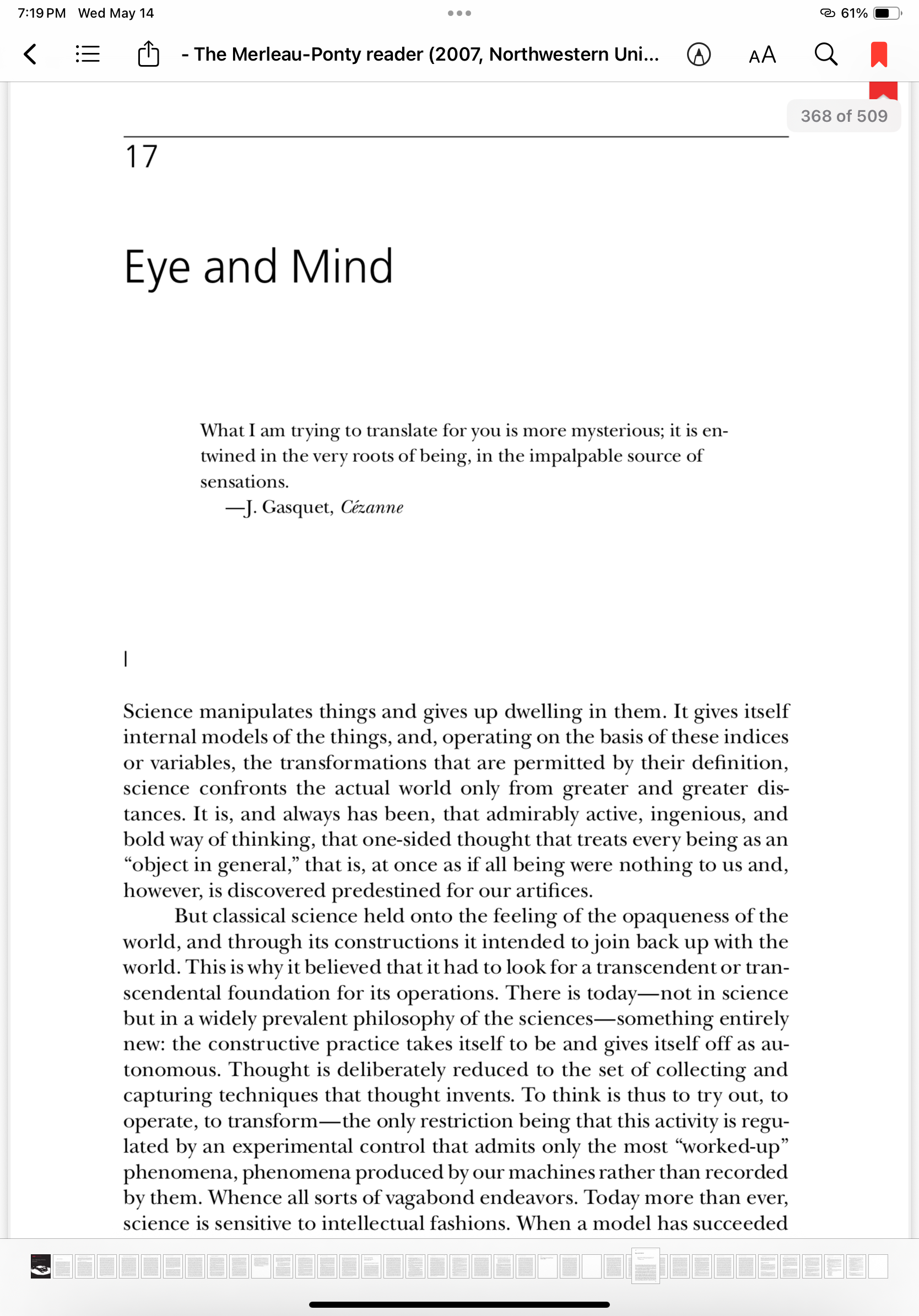<독서 노트>
5장 「감성적인 것의 비대칭적 종합」에 나오는 공-간spatium을 데란다DeLanda의 『강도의 과학과 잠재성의 철학』에선 강도공간intensive saptium이라고 표현한다. 다양체들에 의해 형성되는 잠재적 연속체.
혼효면(ATP), 내재면(WP), 탈기관체(AO, ATP), 기계적 퓔룸machinic phylum (ATP), 이데아적/형이상학적 표면(LS), 등등 연결되는 개념.
*
2장 「대자적 반복」에 나오는 ’수동적 종합‘은 시간을 계량화하는 또는 그것에 측도를 부여하는 살아있는 현재들living presents의 종합으로 설명한다. 이 종합에서 ‘수동적 자아’ ‘애벌레 주체’가 나온다. 개인적으로 재밌다고 생각하는, 관조contemplation다.
> 이 ‘관조들’은 미생물에서까지 일어나는 원지각proto-sensation들과 원감정proto-feelings들의 형식으로 어느 곳에서나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에 대한 심리학적 감각을 종합하기 위해 순간들을 수축하는 것만이 아니다. 우리 자신이 미세수축들과 그것들의 현재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 (강도의 과학과 잠재성의 철학)
> 우리는 수축된 물, 흙, 빛, 그리고 공기로 이루어져 있다—이것들의 재인reminiscence 또는 재현representation에 앞서서,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감각되기도 전에. 모든 유기체들은 그 수용적이고 지각적인 요소들에서만이 아니라 또한 그 내장에서도 수축들, 과거지향들retentions과 기대들의 총화이다. < (차이와 반복)
*
어두운 전조(예고자)dark precursor는 의사-원인 작동자quasi-cause operator로 설명한다. 어떤 우발점aleatory point, 무의미(LS), 탈주선이나 추상기계(ATP), 욕망하는 기계(AO), 개념적 인물(WP) 등등으로 다르게 표현되는 용어.
*
데란다DeLanda의 『강도의 과학과 잠재성의 철학』에는 부록으로 「들뢰즈의 용어법」이 실려 있다: DeLanda, Intensive Science and Virtual Philosophy.
『차이와 반복』 5장은 이렇게 아름다운 문장으로 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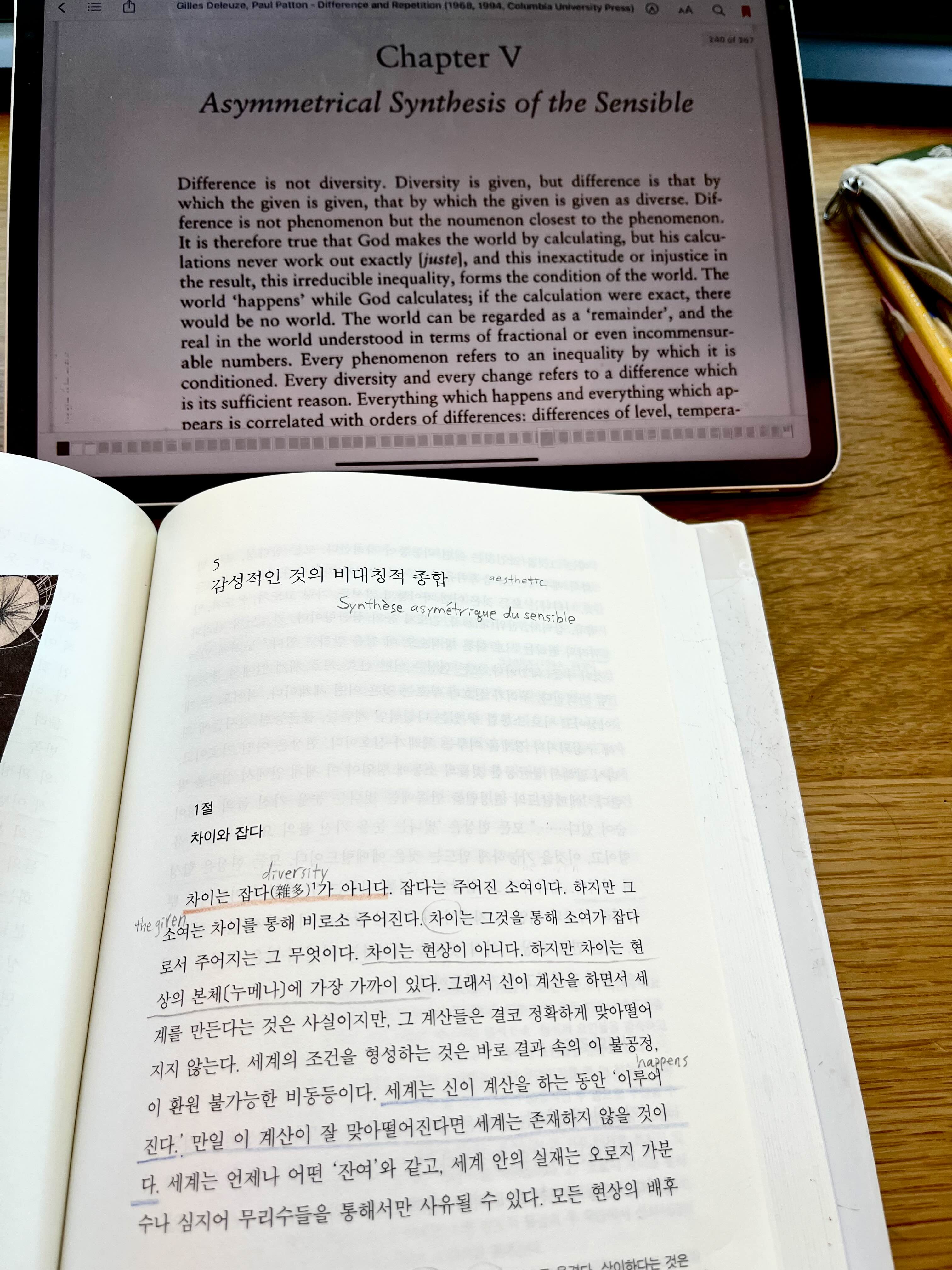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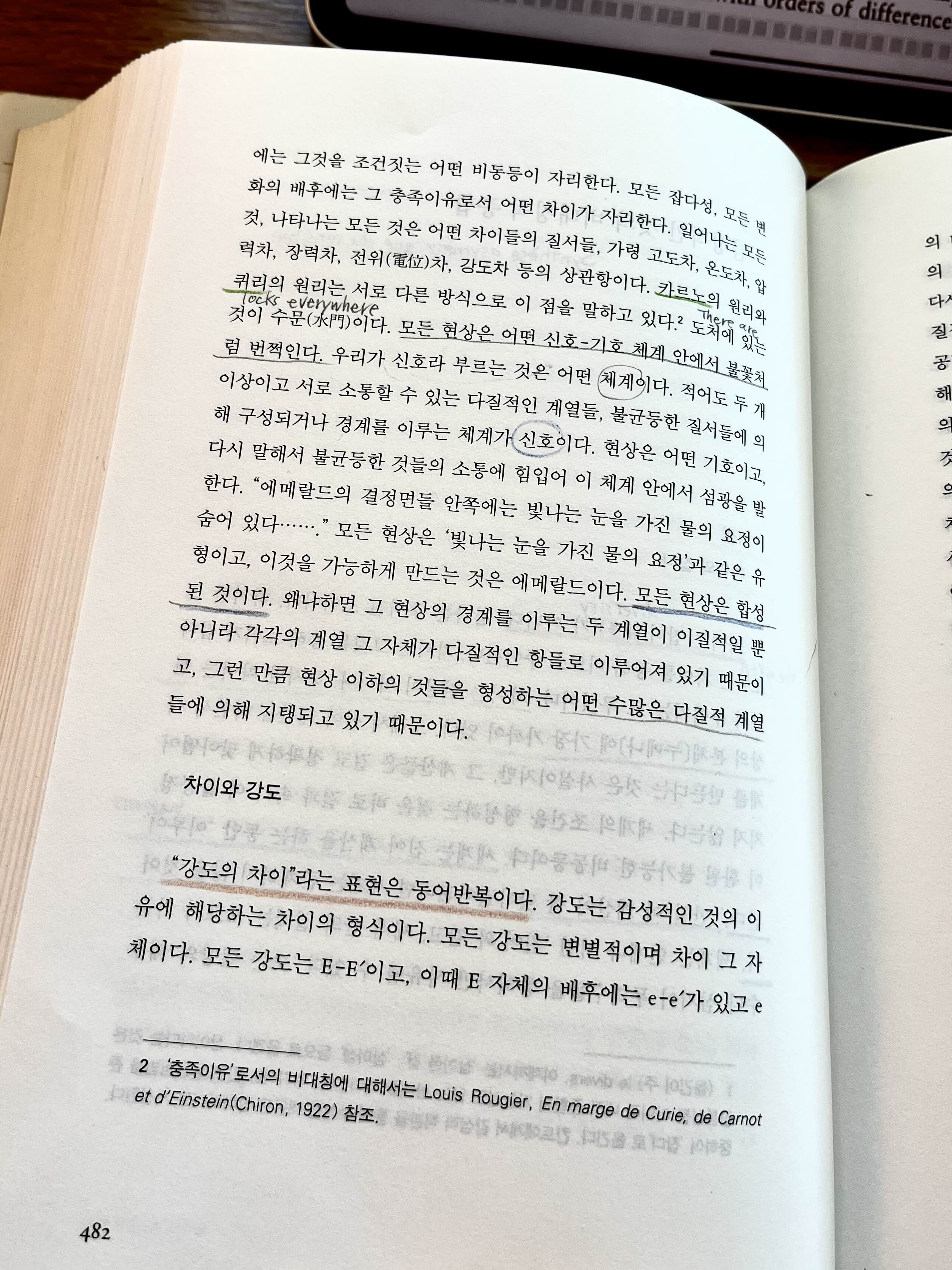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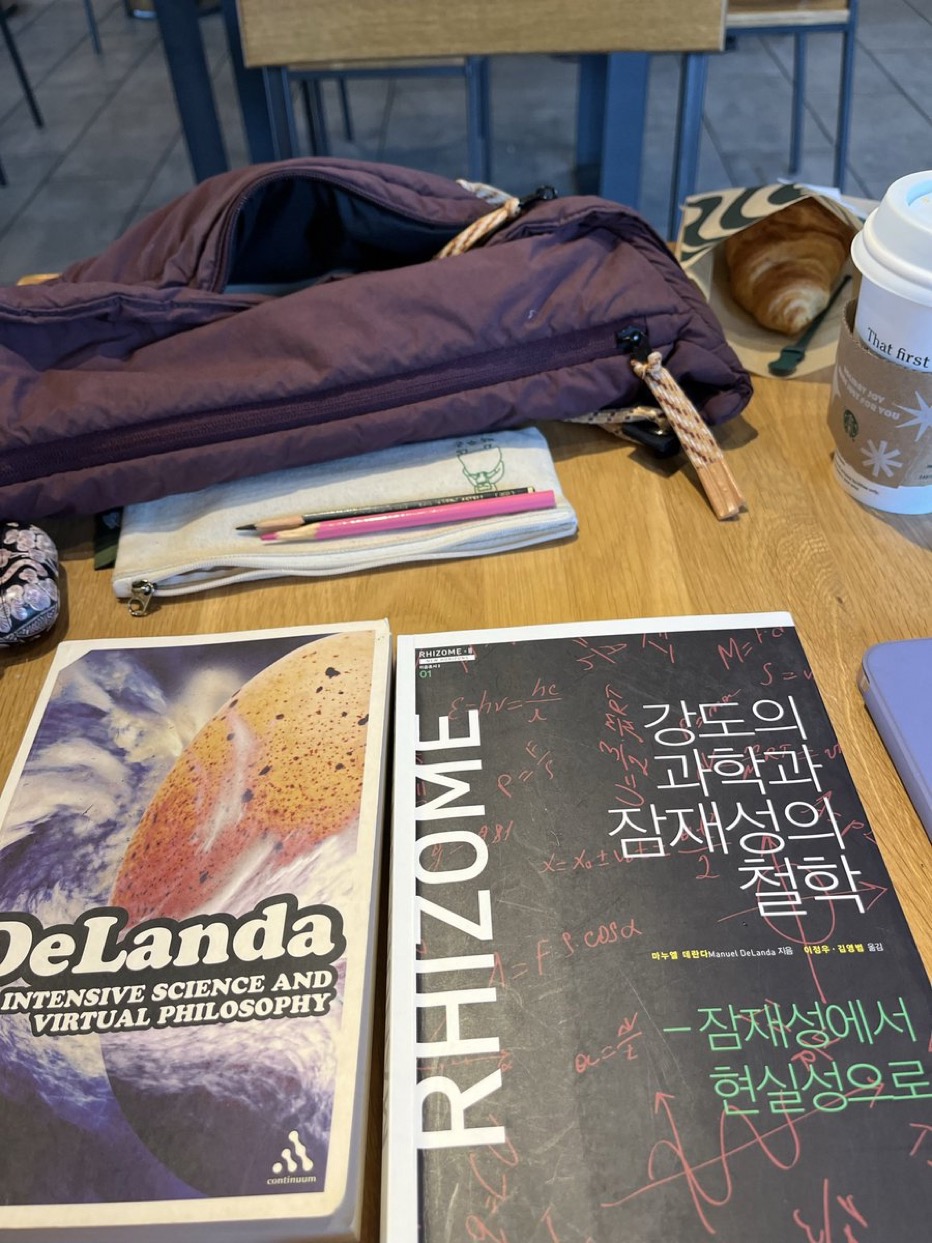
<독서 노트>
거칠게 약간은 경솔하게 말하자면, 4장은 이념 즉 다양체의 장이고 5장은 강도intensity의 장이다. 5장엔 ‘영원회귀‘와 ’힘의 의지’가 인상 깊게 표현되어 있다. 강도가 집 안을 침입하듯 거침없이, 강도intensity로서의 차이와 반복으로.
> 강도량들의 윤리학은 단지 두 가지 원리만을 지닌다. 가장 낮은 것까지 긍정하기, 자기 자신을 (너무) 설명하지 않기, 다시 말해서 자신의 주름을 (너무) 바깥으로 펼치지 않기가 그것이다. <
—5장, 감성적인 것의 비대칭적 종합
*
<독서 노트>
5장 제목 “감성적인 것의 비대칭적 종합”이 뜻하는 바는 본문에 친절히 나온다.
> 강도intensity는 적어도 우월하고 열등한 두 계열 위에 구축되고, 각 계열의 배후에는 다시 어떤 다른 계열들이 함축되어 있다. 그런 한에서 강도는 심지어 가장 낮은 것까지 긍정하고, 가장 낮은 것을 어떤 긍정의 대상으로 만든다. … 모든 것은 독수리의 비상이고 모든 것은 돌출, 불안정한 중지, 그리구 하강이다. 모든 것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고, 이런 운동을 통해 가장 낮은 것을 긍정한다. 이것이 바로 비대칭적 종합asymmetrical synthesis이다. <
> 감성적인 것의 존재는 무엇인가? 이런 물음의 조건들에 따를 때, 그 답변은 어떤 역설적 사태를 가리켜야만 한다. 그것은 (인식능력의 경험적empirical 실행의 관점에서) 감각될 수 없지만 동시에 (초월적transcendent 실행의 관점에서는) 오로지 감각밖에 될 수 없는 ‘어떤 것something‘이다. […] 감성적인 것’의‘ 존재를 구성하는 것은 강도 안의 차이이지, 결코 질 안의 상반성이 아니다. It is difference in intensity, not contrariety in quality, which constitutes the being 'of' the sensible. <
*
5장의 후반부는 개체화individualisation가 주제다.
> 운동은 다만 잠재적인virtual 것에서 현실화actualisation로 향하고, 이런 운동은 그 중간 단계로 어떤 규정적 지위에 있는 개체화individualisation를 지난다. <
일종의 미분화differentiation된 질료라고 볼 수 있는 유전자DNA라는 잠재적인 것은, 실제로 translation을 통해 mRNA에서 아미노산으로 현실화actualisation될 때 세포질cytoplasm이라는 개체화의 장이 필요한 것처럼.
*
인텐시티의 윤리학 원리 중에 하나인 자기 자신을 (너무) 설명하지 않기, 추가 설명이 끝부분에 나온다
> “자신을 지나치게 설명하지 말라.”는 규칙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보다 타인과 더불어 자신을 지나치게 설명하지 말라는 것, 타인을 지나치게 설명하지 말라는 것, 자신의 함축적 가치implicit value들을 유지하라는 것, [어떤 가능한 세계의 표현에 해당하는] 타인 모두를 우리의 세계에 서식하도록 만들면서 이 세계를 증식시키라는 것 등을 의미한다. <
*
강도intensity의 장인 5장에는 알egg, 수정란embryo, 깊이, 거리 등등의 용어들이 나오는데, 특히 ‘깊이’가 인상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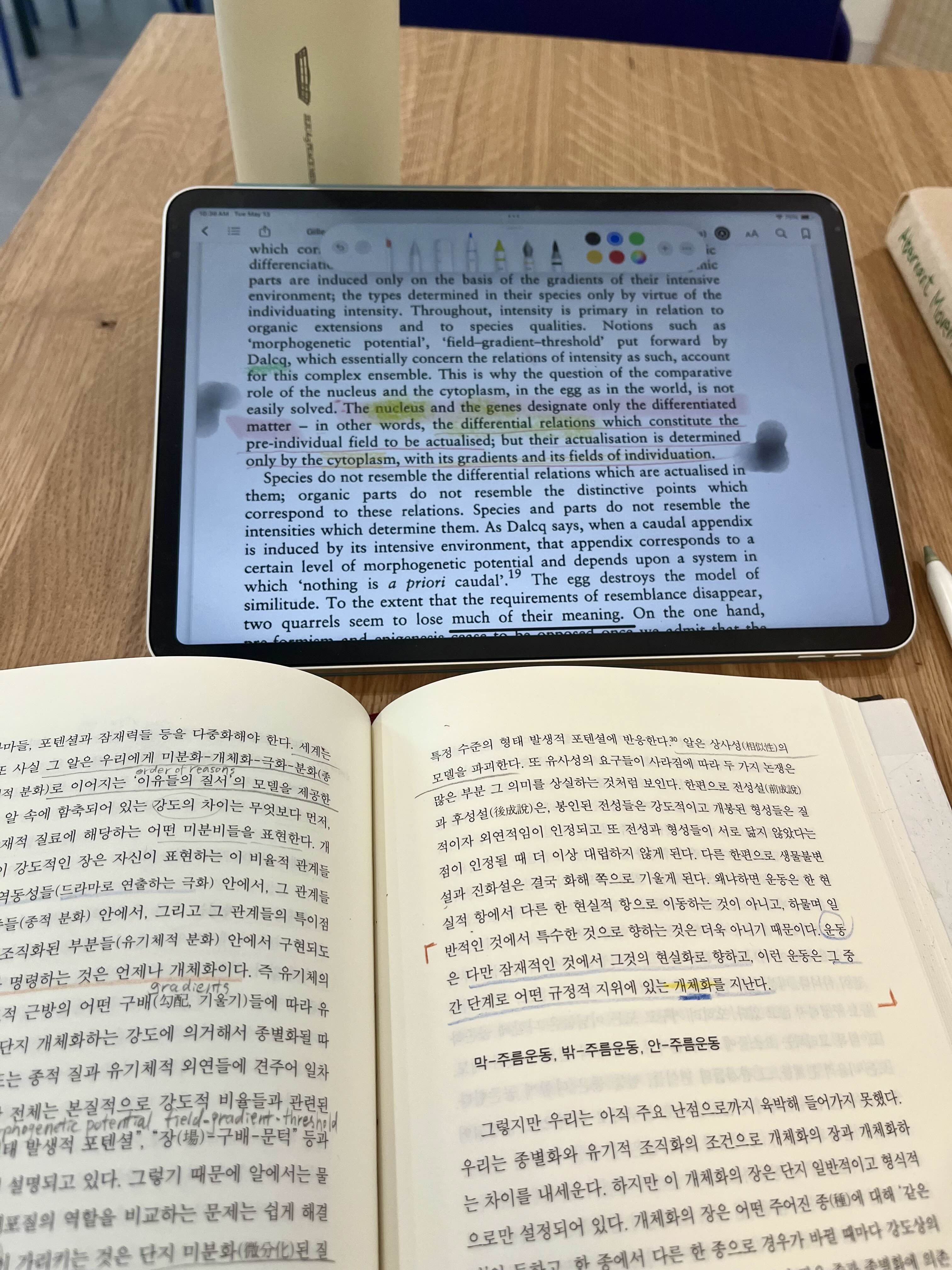
*
<독서 노트>
5장에 나오는 공-간spatium은 한 마디로 말하자면, 강도적intensive 깊이depth다. 그리고 ‘깊이‘는 우리가 흔히 쓰는 깊이가 아니다. 빨간색 알약을 먹을 필요가 있다. 그래야 ‘보인다.’
만유인력의 법칙에서 말하는 질량을 가진 물체가 당기는 중력이라는 신비한 끌어당김은, 물체가 시공간의 곡률curvature을 따라 쪼르르 굴러가는 것으로 볼 수 있듯. 수영장 깊이가 장난이 아니네, 라고 할 때의 ‘깊이‘가 주는 시각적 인상을 지우고 다르게 봐야 한다.
메를로-퐁티에게 깊이는 보는 각도에 따라 깊게 얕게 보이는 '폭breadth'과는 다른 그 무엇이다. 지각할 수 있는 어떤 공간적 개념이 아니라 추상적인 것. 가령, 저기 의자가 있다라고 할 때 우리가 표현하는 어떤 부피감voluminosity같은 것이다. 질quality과 공간space의 발생은 따로 나누어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 된다. "We must seek space and its content as together" (Merleau-Ponty, Eye and Mind)
들뢰즈가 말하는 깊이depth는 공간과 공간 안의 내용이 함께 하는, 따로 떨어져 생각될 수 없는 공-간spatium이다. 그리고 이 공-간은 강도량intesive quantity에 해당하는 공간이다.
메를로-퐁티의 이론에 따라, 질과 공간이 동시적으로 같이 발생하는 것이라면, "모든 연장extensity 전체는 깊이들에서 나온다" 라는 5장의 문장은 이해가 된다. 그래서, '깊이'는 주름을 펼치는 것이라고 표현한다. 주름을 펼친다explicate는 것은 어떤 질quality과 공간space이 같이 발생한다는 의미가 된다 (메를로-퐁티적으로 해석하자면). 그리고, 이것이 강도의 차이, 차이나는 강도, 주름을 펼치는 강도intensity다.
*
“깊이는 연장의 모태matrix of all extensity이다.”
“깊이는 바깥으로부터 길이와 넓이에 덧붙여지는 것이 아니다. 깊이는 다만 그 길이와 넓이를 창조하는 분쟁의 숭고한 원리로 깊이 은거하고 있을 뿐이다.”
"깊이는 본질적으로 연장의 지각 안에 함축되어enveloped 있는 것처럼 나타난다."
"깊이는 지각 불가능한 것인 동시에 오로지 지각밖에 될 수 없는 것이다."
"깊이는 존재의 강도이고, 거꾸로 강도는 존재의 깊이다. 그리고 이 강도적 깊이에서, 바로 이 공-간에서 외연extensio과 연장extensum, 물리학적 질qualitas과 감각적 질quale이 모두 동시에 나온다."
*
메를로-퐁티의 현상학을 빌면, 이해하기가 더 쉽다. 물론, 여기에 시간의 세가지 종합이 대입되면서 '깊이'와 연장, 주름운동들은 더 복잡하게 얽히지만.
메를로-퐁티Merleau-Ponty가 갑자기 나와서 왜? 했는데, 세 해설서 중 '깊이'를 이해하는데는 젤 그럴듯 했다. 탱큐, 서머스-홀Somers-Hall.